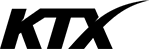나무와 나 나무 나
김지녀
잎이 돋을 때
공원에는 나무와 나 나무 나무 사이에 나뿐이어서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무, 가 된다는 상상이 문학적으로 실패란 걸 알지만
나무, 가 된다면 적어도 오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나무와 나무 나 나무 사이에 나무는 나와
나 사이 나무의 나무
그새 잎들이 짙어졌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
나무 나무 나무와 나 사이에 나 나무가 흔들렸다
새들이 갑자기 날아갔다
누군가 숨어 있다
나무를 천천히 만지니까
손끝에서 얇은 가지 하나가 쑥 돋아났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었다
-
처음 시를 배울 때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님에 대한 시는 쓰지 말라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선배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진부한 주제다, 엄마 아빠에 대한 시는 이미 너무 많은 시인이 썼으니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으로 멋진 시를 쓸 게 아니면 쓰지 마라. 그래서 나도 후배들에게 그대로 말해 준 것 같다. 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시를 내가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다른 선후배 시인들도 마찬가지다. 쓰지만, 쓰면서도 조심스러운 대상, 그게 우리 엄마 아빠인 것.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쓰는 시 속 주인공이 되기 어려운 존재. 신파 같으니 여기까지.
나무도 그렇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 중 손에 꼽힐 텐데, 나무는 시에서 진부한 대상이다. 초등학교 백일장에 출품된 작품을 보면 절반 정도가 나무에 대한 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무에 대해 쓰거나 그렸다. 그러니 나무는, 부모님만큼 진부하다. 늘 우리 옆에 있는 건 진부해지고, 진부한 것은 문학의 소재가 되지 못한다. 물론 정확하게 적자면, 진부하게 쓰는 것이 문제겠지만. 나는 나무와 엄마와 아빠가 다 등장하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와, 이걸 정말 내가 썼다고? 역시 이우성 천재’라고 혼자 감탄하고, 다음 날 아침에 파일을 지웠다. 그것은 군대에서 축구를 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진부했으며, 심지어 손발이 오그라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아빠에 대한 시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모두 좋아하며, 나무 역시 그렇다. 무엇인가를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인 작품을 쓰겠다는 포부 같은 건 당연히 없다.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쓰는 게 오히려 진취적인 거 아냐?’라고 혼자 생각한다. 나무에 대해 쓴 시인도 좋아한다. 특히 더 좋아하는 건, 나무에 대해 뭐라고 썼는지 추측해 보는 것.
시의 제목이 왜 ‘나무와 나 나무 나’인지는 시를 읽고 장면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시인이거나 시에 등장하는 사람, 즉 화자는 공원의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들 사이에서 올려다보고 있다.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나무에 대해 시를 쓰고 싶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게 아닐까. “나무, 가 된다는 상상이 문학적으로 실패란 걸 알지만/ 나무, 가 된다면 적어도 오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두 문장만으로도 시지. 가끔은 어떤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시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 시를 쓴 김지녀 시인에게도 새삼 그러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 마음을 담은 메일일 것이다.
“문학적으로 실패”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고, 나무를 상상하는 대신 정말 나무가 된다는 표현과 의지가 나는 많이 좋다. 물론 나무가 된다는 건, 정말 그렇게 느껴지게 시를 쓰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은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나무’가 될 수 없다. 나무와 나무들 사이 ‘나’일 수밖에 없다. ‘나’가 완벽하게 나무가 되는 건… 음.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워 버리잖아!
제목을 다시 보자면 ‘나무와 나 나무 나’이다. ‘나 나무’ 사이에 ‘와’를 넣어야 올바른 표현일 텐데 뺐다. 그래서 ‘나 나무 나’로 읽힌다. 나가 나무 같고 나무가 나 같다. 정말 나무가 되고 싶어, 라는 순수한 의지도 읽힌다. 그러니 진부하게 또 나무에 대한 시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좋아, 라고 나는 이 시를 소리 내어 읽으며 방금 말했다.
그런데 시인이 아닌 사람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어떤 상상을 할까? 예쁘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굳이 나무가 되어야겠다는 상상은 안 하려나? 그렇다면, “나무, 가 된다면”이라는 문장은 의지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좋은 시를 쓰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시인의 일상을 온통 시로 채워 버려서, 문학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나무에 대한 시를 쓰게 만든 걸까? 잠시 공원을 거닐며 나무를 올려다보는 순간조차 시를 잊을 수 없었을까(이 지면에서 늘 적는 이야기지만, 이런 시인과 동료라는 사실이 나는 정말 좋다).
그러나 시인은 알고 있다. 나무가 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오늘의 성공’이라는 것.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무의 삶을 살건, 자신의 현실 속으로 돌아가건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기차에 탑승한 승객이니까. 아, 진부해. ‘시간이라는 기차’라니! 내가 썼지만, 내가 봐도 진부해. 그래서 뜬금없이, 오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진부한 건 진부한 대로,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서 올려다보면 나는 앞으로 김지녀 시인이 떠오를 것 같다. 진부하고 소중한 나의 엄마와 아빠도. 진부한 나무가 시를 통해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